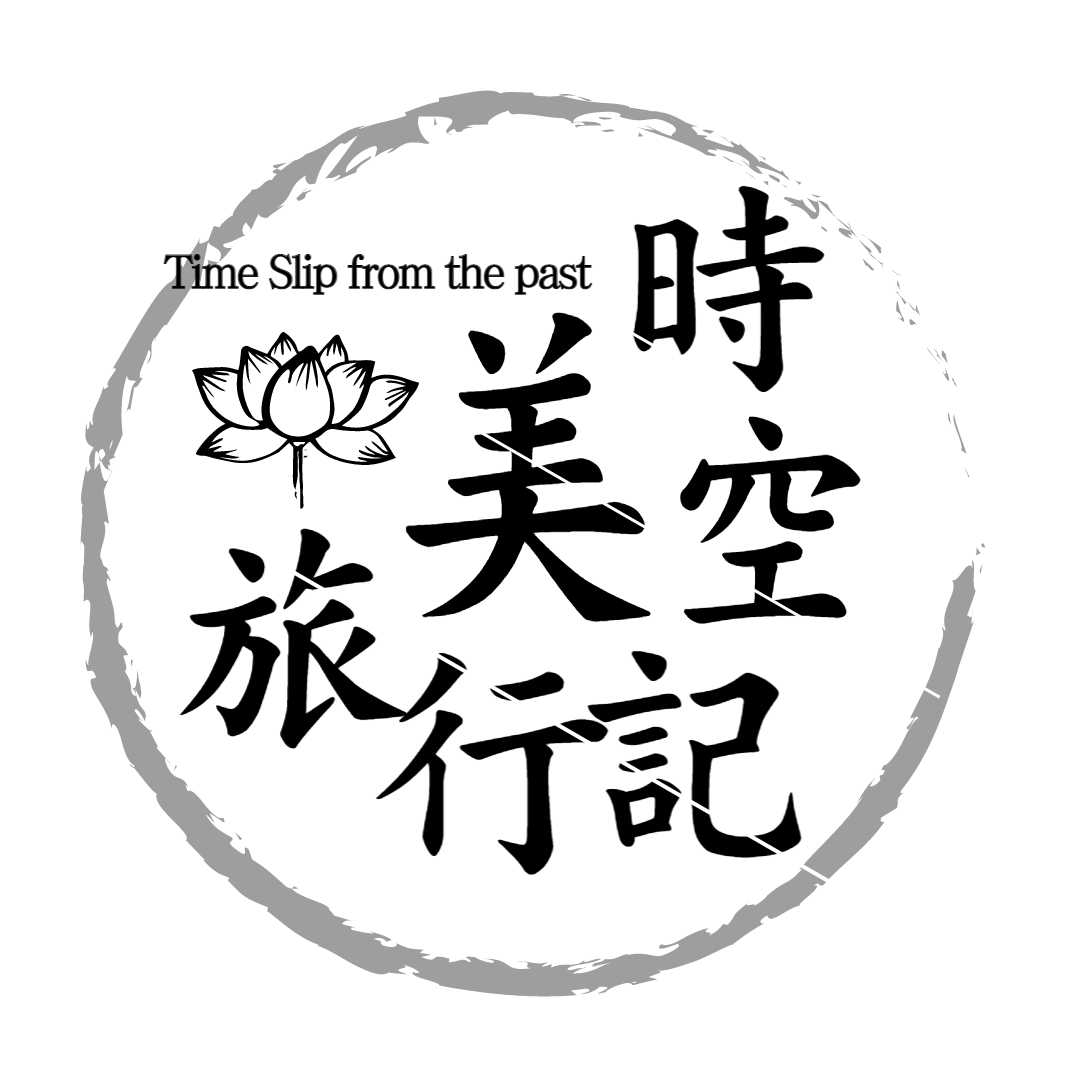1. 들어가며: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느 날, 한 편의 아름다운 글을 읽었다. 단정한 문장, 고요한 리듬, 사유의 결이 촘촘히 이어지는 문단들. 나는 순간, 이렇게 물었다.
“이 글, 혹시 AI가 쓴 건 아닐까?”
이제는 누구나 이런 질문을 품는다.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어딘가 익숙한 언어로 엮인 그 문장은 어쩌면 인간이 아닌 기계가 학습한 수많은 말들의 조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쓴 글과 인공지능이 쓴 글의 경계를 더 이상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 AI가 글을 쓰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2022년, OpenAI의 ChatGPT가 공개된 이후, 세계는 뒤바뀌었다.
단순한 문장 생성 도구가 아니라, 에세이, 시, 보고서, 논문 초안, 심지어 소설까지 척척 써내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전율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 후, Claude, Bard(Gemini), Bing Copilot, 문카(Moonka) 등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일상은 "AI가 쓴 글"로 점차 채워지기 시작했다.
SNS에서 유행하는 짧은 글, 블로그 후기, 온라인 기사, 리포트 초안…
그 어디에도 사람의 손길만이 묻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시대. 우리는 지금, “의심”과 “신뢰” 사이에 선 독자들이 되어가고 있다.
📌 우리는 왜 ‘이 글, AI가 쓴 걸까?’라고 묻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산물이 아니다. 그 뒤에는 세 가지 깊은 문제의식이 숨어 있다.

- 진정성에 대한 의심
우리가 읽는 글이 누군가의 생각과 감정,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글은 과연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닌 기계가 쓴 글에서 감동을 느꼈다면, 그것은 우리 안의 ‘공감’이 변한 것일까? - 창작의 본질에 대한 흔들림
"쓰는 자가 곧 생각하는 자"라는 말은 오랜 문학적 전통 속에 뿌리내려 있다.
그러나 AI가 인간처럼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쓰는 행위"가 곧 "창의성"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 신뢰의 기준이 모호해짐
정보의 출처가 모호하고, 생성된 콘텐츠가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 때,
독자는 어떤 기준으로 진실을 구별해야 할까?
이 모든 물음은, 결국 한 가지로 수렴된다.
“우리는 AI가 쓴 글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일까?”
📌 감별의 시대가 열렸다
이 질문에 답하고자, 지금 수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AI 글 판별기’를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시스템들이 등장했다.
- GPTZero – 교사와 교수들이 학생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
- OpenAI’s AI Text Classifier – OpenAI에서 자체 개발한 감별기
- Turnitin의 AI Detector – 교육기관에서 표절 탐지와 함께 사용하는 AI 탐지 시스템
- HuggingFace AI Output Detector – 오픈소스 기반의 실험적 감별기
이 감별기들은 통계적 모델, 퍼플렉서티(perplexity), 버스트니스(burstiness)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글이 “AI스럽게 쓰였는지”를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글은 인간이 썼지만 AI로 오인되고, 또 어떤 글은 AI가 썼지만 인간의 글처럼 보인다.
AI 판별 기술은 마치 안개 속에서 사람을 알아보려는 시도처럼 불완전한 도구로 불완전한 세계를 해석하려는 노력에 가깝다.
📌 "진짜"는 어디에 있는가?
문학의 세계에서 ‘진짜’는 글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의 울림에 있다.
그러나 정보의 세계에서는 출처와 창작자가 진실을 담보한다.

우리는 지금 이 두 세계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다.
어떤 글은 너무 아름다워서 믿기 어렵고, 어떤 글은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기계의 작품 같고, 어떤 글은 어딘가 모르게 기계적인 감성이 묻어나 인간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는 AI가 만든 ‘거짓된 진짜’와, 인간이 만든 ‘진실한 거짓’ 사이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해야 할까?
📌 감별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단순히 "이 글, AI가 쓴 거야!"라고 밝혀내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감별의 기술에 사로잡힌 채 본질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감별이 아니라, AI가 쓴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그 글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이다.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보다 의미와 가치를 구별하는 눈이 더 필요하다.
그 눈은 기술이 아닌, 결국 인간의 사유에서 비롯된다.
🕊️ 마무리: 글을 쓰는 자, 읽는 자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는 글을 쓰고, 그 글은 사람의 마음에 닿기도 한다.
그러나 그 글을 어떻게 읽을지,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우리는 이제 기술을 감별하는 시대를 지나, 의미를 감별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은 2부, 「AI가 쓴 글의 특징은 무엇인가?」 로 이어지겠습니다.
'생각해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I 감별 기술은 어떻게 작동하나? (0) | 2025.04.05 |
|---|---|
| AI가 쓴 글의 특징은 무엇인가? (1) | 2025.04.05 |
| 나의 문제인가, 구조의 문제인가?” –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본 청년의 삶 (1) | 2025.04.03 |
| 체계적인 글쓰기의 비밀: IRAC을 활용한 논리적 전개법 (0) | 2025.03.09 |
| 가짜 뉴스의 전염병, 인포데믹스! 어디서 시작됐을까? (0)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