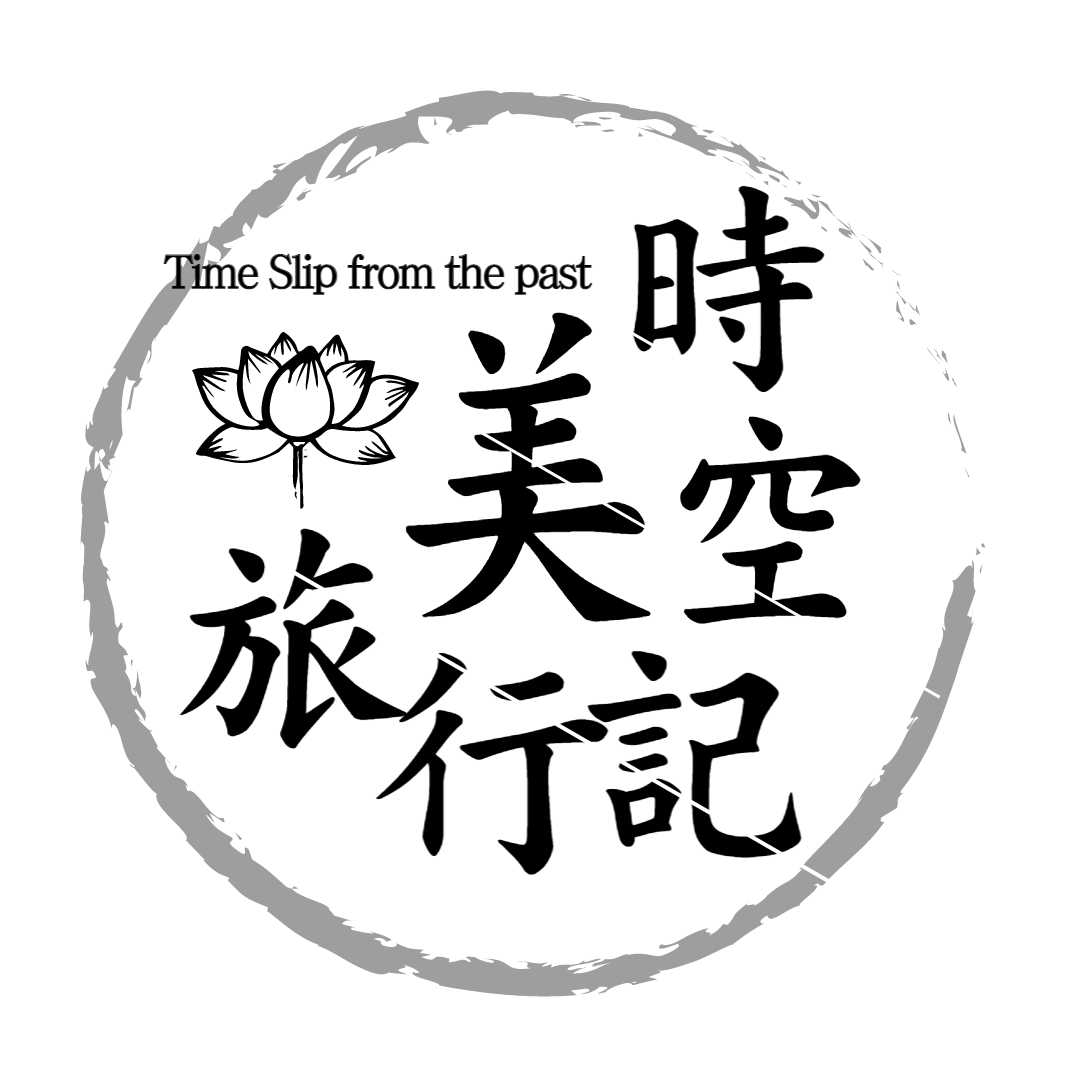2025.04.04 - [생각해보기] -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1. 들어가며: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어느 날, 한 편의 아름다운 글을 읽었다. 단정한 문장, 고요한 리듬, 사유의 결이 촘촘히 이어지는 문단들. 나는 순간, 이렇게 물었다. “이 글,
storymoti.com
그럼 2부,「AI가 쓴 글의 특징은 무엇인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 AI가 쓴 글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인간이 만든 언어의 경계에 선 기계
우리는 누군가의 글을 읽으며 그 사람을 상상한다.

문장의 어투, 단어의 선택, 리듬의 결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감정, 그리고 삶의 결이 은은히 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AI가 쓴 글 앞에서는 이러한 상상이 멈춘다.
그 글은 깔끔하지만 어딘가 비어 있고, 자연스럽지만 어쩐지 낯설다.
과연 우리는 AI의 흔적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기계가 쓴 글에는 어떤 고유한 패턴이 존재하는가?
퍼플렉서티(Perplexity): 예측 가능한 언어
AI 텍스트 감별 기술의 핵심 지표 중 하나는 퍼플렉서티(perplexity)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는 "혼란스러움"을 뜻하지만, 자연어처리에서는 다음 단어가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를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 인간은 때때로 파격을 쓴다. 말장난을 하거나, 비유를 비틀고, 문법을 어긴다.
- 그러나 AI는 확률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문맥상 잘 이어지는 단어를 고른다.
이 말은 곧, AI가 쓴 글은 너무 예측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 예측 가능성은 독창성과 창의성을 지우며, 글 전체를 무난하지만 밋밋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봄이 오면 마음이 설렌다.”
라는 문장을 AI는 수없이 재현할 수 있다.
하지만
“봄은 내 마음속 먼지 쌓인 기억을 햇살로 쓸어낸다.”
와 같은 표현은, 인간의 삶의 조각을 품고 있기에 가능한 문장이다.
버스트니스(Burstiness): 단조로운 문장 흐름
또 하나의 특징은 버스트니스(burstiness), 즉 문장의 리듬과 패턴의 다양성이다. 인간은 어떤 문장은 길게 쓰고, 어떤 문장은 짧게 끊으며, 감정에 따라 리듬을 조절한다.
- 사람은 "글을 말하듯이" 쓴다.
- 반면 AI는 훈련된 틀 안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글을 뽑아낸다.
이 결과, AI가 쓴 문장은 아래와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제품은 매우 효과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전형적인 리뷰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감정의 파동이나 문장의 굴곡이 없다.
AI는 의미는 담지만, 감정의 높낮이는 표현하지 못한다.
지나친 정제와 중립성
AI의 문장은 때때로 너무 정제되어 있어 낯설다. 그것은 마치 감정을 눌러 담은 글처럼 느껴진다.
- AI는 감정을 표현하려 하지만, 감정의 뉘앙스를 ‘계산’한다.
- 결과적으로, AI의 글은 감정이 없는 ‘감정 표현’이 되기 쉽다.
예를 들어,
“그는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AI는 ‘매우’와 ‘슬퍼’라는 단어를 골라내지만,
정작 ‘왜’ 슬픈지, 어떤 식으로 드러났는지에 대한 묘사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마치 촘촘하게 빗질된 말장식은 있으되, 그 속에 살아 있는 숨결은 없는 시와 같다.
창의성의 모방, 모방의 한계
AI는 수많은 텍스트를 학습하고, 그 안의 패턴을 모방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방이 때때로 창의성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I에게
“눈물의 소금이 바다를 이루었다.”
라는 문장을 써달라고 하면,
AI는
“슬픔이 가득한 눈물이 흘러, 끝없는 바다로 퍼졌다.”
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AI는 상징을 ‘창조’하지 않고 ‘조합’한다.

그 결과,
그럴듯하지만 ‘익숙한 비유의 재조합’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로 인해 기시감 있는 창의성, 즉 ‘어디서 본 것 같은 문장들’이 자주 등장한다.
📊 5. 사실 정보의 나열, 서사의 부재
AI는 정보 전달에 강하지만, 경험을 서사로 엮는 능력에서는 인간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한 여행기를 쓸 때 인간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고요한 기차 안, 스치는 풍경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문득 떠올랐다.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그 기억도 흘러갔다.”
AI는 이런 글 대신,
“기차는 매우 편안했고 풍경은 아름다웠다. 강이 보였다.”
라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나열에 머무르기 쉽다.
이것이 AI 글의 한계다.
정보는 있으되, 그 정보를 통해 재구성된 ‘삶의 이야기’는 결여되어 있다.
논리적 비약이 없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다’
AI는 글을 쓸 때, 문단 간의 연결이 매우 논리적이다.
어색한 전환 없이, 무리한 비약도 없이 진행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너무나 매끈한 논리가 때로는 생기 없는 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 인간은 모순되고, 때론 비약하며, 갑작스레 감정의 결론에 도달한다.
- 그러나 AI는 항상 논리적 일관성을 우선시한다.
그 결과, AI가 쓴 글은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 ‘기획된 구조’처럼 느껴진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건 너무 잘 짜였어. 오히려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인용을 잘하되, 출처가 모호하다
AI는 학습한 정보에서 많은 것을 끌어온다. 하지만 때때로 출처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용을 생성하기도 한다.
- 이는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학술자료나 책 제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 때문이다.
- 특히 GPT 계열의 모델들은 이런 환각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이 때문에, 학술 글이나 뉴스 기사에선 AI가 쓴 글이 ‘정확해 보이지만 검증이 어려운’ 위험성을 동반할 수 있다.
📌 요약: AI 글의 주요 특징
| 항목 | 인간의 글 | AI의 글 |
| 퍼플렉서티 | 예측 불가능, 파격 존재 | 예측 가능, 통계적 자연스러움 |
| 버스트니스 | 문장 길이 다양 | 일정한 구조, 반복적 패턴 |
| 감정 표현 | 경험 기반, 서사적 | 중립적, 정제됨 |
| 창의성 | 독창적인 비유, 직관적 연상 | 조합 기반, 익숙한 표현 재사용 |
| 정보 서사 | 경험과 감정이 결합된 흐름 | 정보 나열 중심 |
| 논리 | 때로는 비약, 모순 포함 | 완벽한 흐름, 구조화됨 |
| 인용 | 실제 자료 기반 | 때로는 가짜 인용 생성 |
이렇게 우리는 AI의 글에서 ‘기계의 흔적’을 찾아내는 눈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을 찾아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기계’적인지, 왜 인간의 글과 다른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다음 3부에서는 이 특징들을 감별하는 기술들, 즉 「AI 감별 기술은 어떻게 작동하나?」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생각해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숫자 패턴 반복? 밈과 루머의 실체 (0) | 2025.04.05 |
|---|---|
| AI 감별 기술은 어떻게 작동하나? (0) | 2025.04.05 |
|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0) | 2025.04.04 |
| 나의 문제인가, 구조의 문제인가?” –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본 청년의 삶 (1) | 2025.04.03 |
| 체계적인 글쓰기의 비밀: IRAC을 활용한 논리적 전개법 (0) | 202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