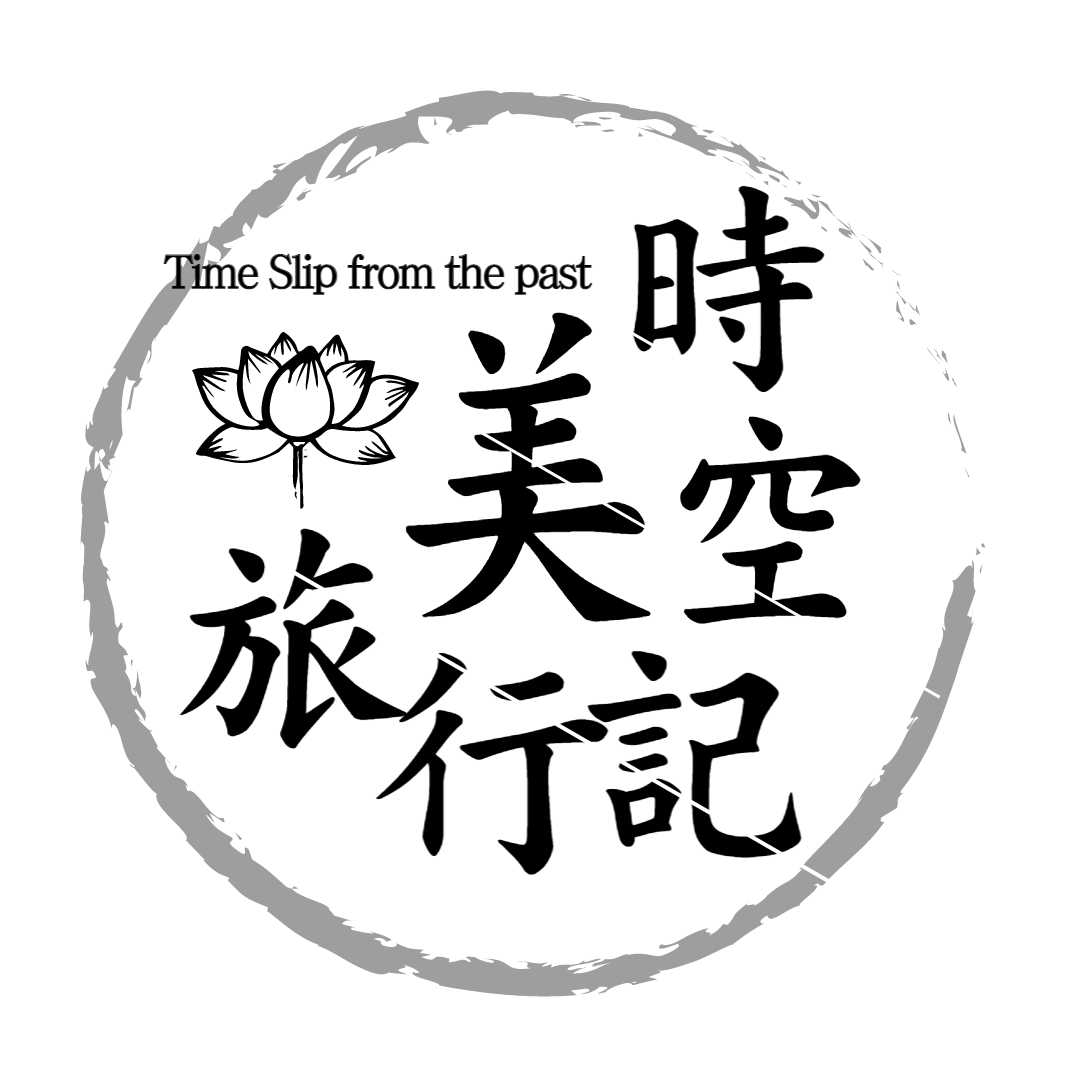Z세대(1997~2012년생)는 소비를 자아·관계·신념의 언어로 씁니다.
제품은 기능을 넘어 나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었고, 같은 브랜드를 쓰는 사람끼리 정체성의 유대감을 느끼는 현상은 더 이상 이상한 사회적 현상이 아닙니다.
2024년 에델먼 스페셜 리포트에서 “같은 브랜드 사용자와 연결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Z·밀레니얼에서 10명 중 6명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브랜드 선택이 “나의 입장 표명”이 된 겁니다.

행동 데이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NYU Stern의 2024 Sustainable Market Share Index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마케팅 제품의 점유율은 2015년 이후 +4.8%p(→ 18.5%)로 커졌고, 팬데믹·인플레이션 고점에도 성장세가 유지되었습니다. 가치 정렬(Value Alignment)이 구매로 번역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동시에 ‘어떤 이슈에, 어떻게’의 정밀함도 요구됩니다.
미국 여론에서는 “기업은 정치에서 한발 비켜서라”는 응답(64%)과, 인플루언서의 입장 표명 기대(87%)가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지의 발신자·맥락·실행이 신뢰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도 MZ는 가치와 진정성을 중시하며, 기후불안이 소비·커리어 의사결정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딜로이트 코리아 2024). 결국 오늘의 브랜드 전략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꿨고, 어떻게 증명하는가?
Z세대의 브랜드 관계는 취향 공동체를 넘어 정체성 커뮤니티로 확장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접속과 상호작용은 소속감과 의례, 그리고 행동 규범을 서서히 축적합니다. 관심사가 촘촘하게 엮인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보다 그 이후의 함께 쓰는 경험을 더 오래 이야기합니다. 브랜드가 만든 캠페인 문구가 기억되는 시간은 짧지만, 철학과 태도가 관통된 운영 방식은 커뮤니티의 대화 주제가 되어 오래 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Z세대는 기능과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때 철학의 정렬과 공동체의 소속감을 결정 요인으로 끌어올립니다.
1) 왜 ‘철학 기반 팬덤’인가: 정체성·연결·신념의 경제학
이 관찰을 경제학적 언어로 요약하면, 한 소비자가 브랜드에서 얻는 효용은 품질과 가격뿐 아니라 가치 정렬과 커뮤니티 정체성에 의해 강화됩니다. 효용을 간단한 모델로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U=\alpha Q+\beta P^{-1}+\gamma S+\delta I \]
여기서 \(Q\)는 품질, \(P\)는 가격, \(S\)는 가치 정렬(ESG·DEI·윤리), \(I\)는 커뮤니티 정체성을 뜻합니다. Z세대의 맥락에서는 \(\gamma\)와 \(\delta\)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커져, 품질과 가격이 유사할 때 \(S\)와 \(I\)가 구매를 가릅니다.
소비자는 그 가치 정렬을 광고 카피에서 찾기보다 지배구조, 공급망, 대표성처럼 검증 가능한 신호를 통해 관찰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ESG 리포트의 숫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채용과 승진, 협력사 관리, 로비 활동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정렬의 증거로 제시될 때 신뢰가 형성됩니다.
2) ESG·DEI·윤리경영: ‘선언’이 아니라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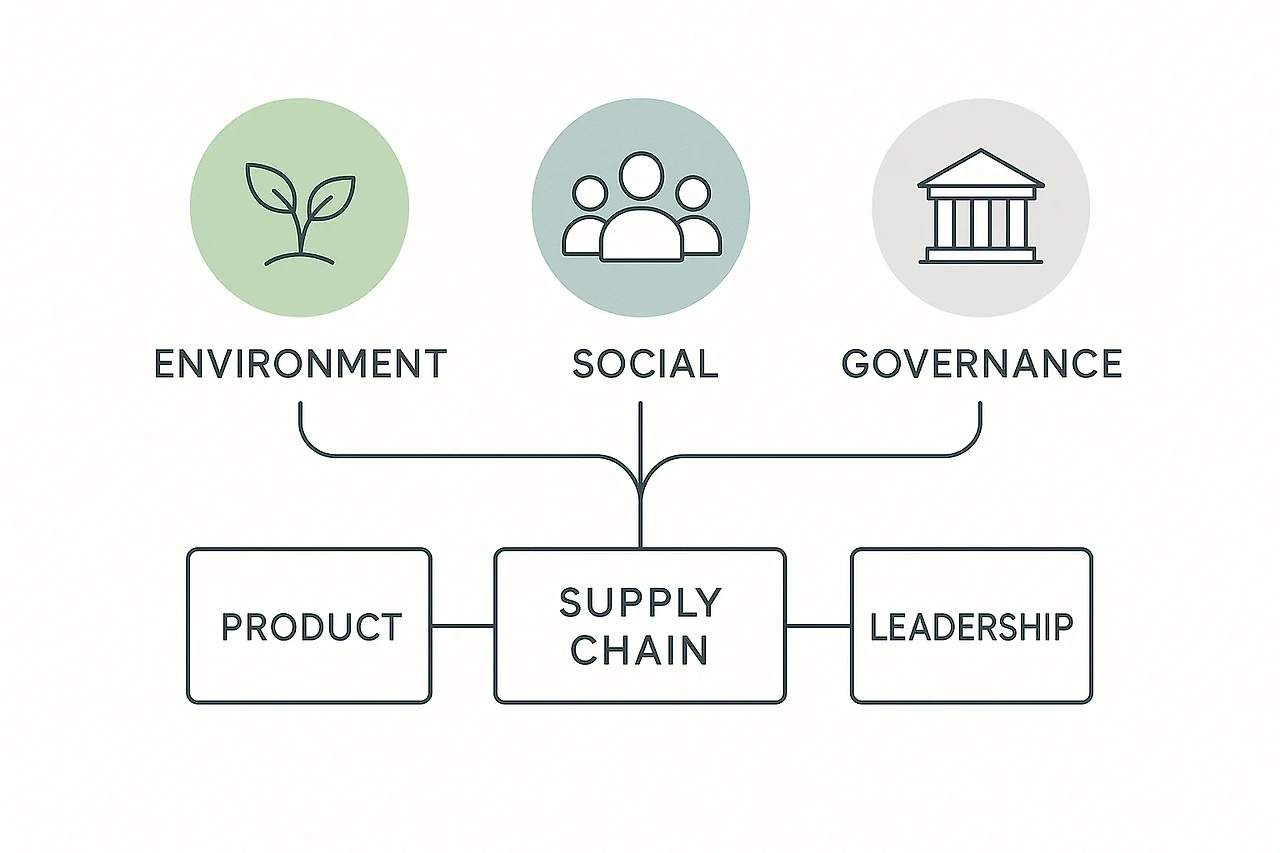

이 지점에서 ESG·DEI·윤리경영은 슬로건이 아니라 설계여야 합니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를 한 프레임에서 다루는 경영 운영 체계입니다.
에너지 전환, 포장 최소화, 원재료 대체, 리사이클 인프라 같은 제품·운영 전선과, 인권 실사와 시정조치처럼 공급망 전선이 맞물릴 때 비로소 고객은 변화의 궤적을 봅니다. NYU Stern의 장기 패널은 지속가능성 마케팅 제품의 구조적 성장으로 수요의 내재화를 보여줍니다.
DEI는 외부 메시지의 꾸밈이 아니라 내부 인사·평가·보상의 기본값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Z세대는 이를 기본 위생요건으로 봅니다.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대표성, 창작 과정에서의 포용 가이드, 고객 접점에서의 접근성 증거가 함께 제시되면 포용은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톤앤매너가 됩니다. 윤리경영은 행동강령과 내부고발 보호, 이사회 레벨의 감독으로 말과 행동의 괴리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선언’은 ‘증거’로 바뀝니다.
용어 한 줄 정의
ESG: 경영의 지속가능·리스크·성장 프레임. DEI: 대표성·공정성·포용성 확보 설계. 윤리경영: 법 준수 너머의 책임 규범 체계.
윤리경영은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행동강령·내부고발 보호·3자 감사로 증명합니다. 이 프레임이 약할수록 그린워싱·핑크워싱 의심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3) 데이터로 본 Z세대의 가치 소비
데이터가 보여주는 변화의 방향도 같습니다.
지속가능 성과를 내세운 제품군은 여러 산업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왔고, 물가와 경기 사이클이 출렁일 때에도 성장 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지불 의사를 계산할 때 포함하는 가치 프리미엄이 가격 저항을 부분적으로 상쇄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격 탄력성으로 적으면, 기존 대비 가격을 \(\Delta p\)만큼 올렸을 때 수요의 근사 변화율은 \(\frac{\Delta Q}{Q} \approx -\varepsilon \frac{\Delta p - \phi}{p}\)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arepsilon\)은 가격 탄력성, \(\phi\)는 가치 정렬이 만들어내는 추가 효용입니다. \(\phi\)가 \(\Delta p\)보다 크면 수요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합니다. 브랜드가 꾸준히 증거를 쌓아갈수록 \(\phi\)는 커지고, 가격 경쟁의 소음 속에서도 신뢰의 방어력이 생깁니다.
2024 스페셜 리포트는 ‘브랜드 선택=정치적 표현’이라는 응답을 제시합니다. 다만 2024 조사 중 일부에선 정치 과열 이슈에서 ‘발언 자제’를 원하는 응답 증가도 포착되어, 메시지의 콘텍스트·적합성·실행력이 관건임을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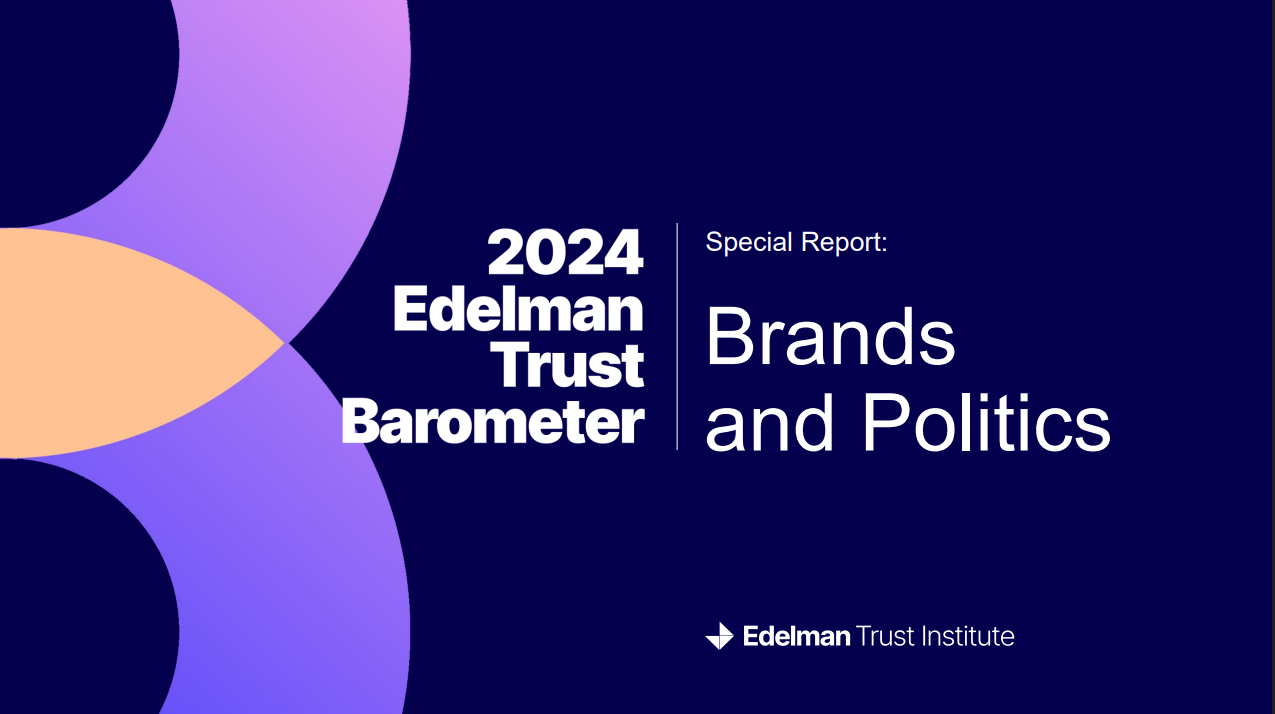
지속가능성의 매출 기여: 2015~2024 기간 지속가능성 라벨 제품의 점유율 상승은 경기 사이클과 무관한 구조 변화로 읽힙니다.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기에도 유지된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가치소비: “가치>가격”, “핵심은 진정성” 인식이 절반 이상이라는 국내 조사 요약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4) 사례 비교: 스탠스의 명암
어떤 캠페인은 핵심 고객과 가치가 정렬된 상태에서 본업의 맥락 안에서 메시지가 발화되자, 논쟁에도 매출과 호감이 상승했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메시지의 적합성과 톤이 핵심 고객의 기대와 어긋나며 장기적 불매로 이어졌고, 특정 아웃도어 브랜드는 “지구가 유일한 주주”라는 선언을 목적 신탁과 비영리라는 지배구조로 고정했고, 팬덤은 캠페인보다 소유 구조에서 진정성을 읽었습니다.

브랜드가 언제·무엇을·어떻게 말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경영 전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공론장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 문제는 우리 핵심 미션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입니다.
실행력이 검증되지 않은 구호는 공염불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제품·운영·거버넌스에서 바꿀 수 있는 구체 항목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그 변화를 데이터로 공개한 뒤, 직원과 창작자, 신뢰받는 인플루언서와 공동 발화를 설계하면 메시지는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
- 성공 – Nike × Colin Kaepernick
캠페인 직후 온라인 매출 +31%. 브랜드 미션(선수, 퍼포먼스) 맥락과 이슈의 정합성이 컸습니다.
Nike Sales Increase 31% After Kaepernick Ad Despite Backlash
After the ad, many Nike customers blasted the decision on social media
time.com
- 경고 – Bud Light
2023년 논란 이후 미국 내 판매·점유율 하락이 수개월 지속. HBR 분석은 “왜 이 보이콧은 예외적으로 오래갔는가”를 정리합니다. 2024년 중반에도 역풍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Lessons from the Bud Light Boycott, One Year Later
Why did the Bud Light boycott affect the beer brand’s sales when many other boycotts have only marginal or short-term impact? An analysis of sales data confirms that Bud Light suffered a sustained downturn in sales, more pronounced in Republican-leaning
hbr.org
- 제도화 – Patagonia
“Earth is now our only shareholder” 선언과 함께 Purpose Trust + Holdfast Collective 구조로 철학을 지배구조에 박제. 팬덤이 신뢰할 증거 구조를 만든 전형입니다.
결국 Z세대의 팬덤은 스토리보다 스탠스, 공감보다 증거, 인상적인 한 번의 캠페인보다 꾸준한 제도에서 힘을 얻습니다. 브랜드가 바꾼 세계의 작은 지점들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그 과정에 팬을 동료로 참여시킬 때, 가치 정렬이 만들어 내는 추가 효용 \(\phi\)는 커집니다. 그 순간 가격 경쟁의 소음은 줄어들고, 브랜드는 철학 위에서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얻게 됩니다.
| 축 | 핵심 질문 | 즉시 실행 | 팬덤 효과·KPI |
| 제품·환경 | 우리 제품은 무엇을 줄였는가(탄소/폐기물)? | LCA 공개, 리필·재사용 모델, 목표-실적 대시보드 | 지속가능 제품 매출 비중, 재구매율, NPS |
| 공급망·인권 | 협력사 기준이 추적·시정되는가? | 인권·환경 실사, 시정 SLA, 감사 결과 요약 공개 | 이슈 발생 시 회복 시간, 위기빈도 |
| DEI·조직 | 리더십·크리에이티브의 대표성 충분한가? | 채용·승진 DEI KPI, 포용 카피 가이드, 크리에이터 보상 | 광고 공감도, 신규 유입군 침투율 |
| 지배구조·윤리 | 말-행동 괴리를 막는 장치는? | 이사회 ESG 감독, 내부고발 보호, 로비 공시 | 신뢰지수, 규제·불매 리스크 |
| 커뮤니티 | 팬이 공동 제작·검증에 참여하는가? | UGC·베타테스트 상설화, 크리에이터 공동 발화 | UGC 비중, 커뮤니티 유지율 |
오늘의 팬덤은 철학 위에서만 자라며, 데이터는 가치·대표성·지속가능성이 실제 매출·점유율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지속가능 제품 점유율 확대, DEI 기대, 브랜드-정체성 유대감). 동시에 기업이 정치에서 거리를 요구받는 맥락이 커지고, 인플루언서 발화 기대가 대체 수단으로 부상합니다.

해법은 분명합니다. 말은 짧게, 증거는 길게—제품·운영·거버넌스의 변화를 데이터로 공개하고, 핵심 미션과 일치하는 이슈만 정밀하게 선택하여 팬과 함께 발화하세요. 그러면 Z세대의 지불 의사를 높이는 가치 프리미엄 $\phi$가 형성되고, 가격·경쟁의 소음 속에서도 신뢰의 방어력이 생깁니다.
이제 팬덤은 철학 위에서만 성장합니다. Z세대는 자신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무엇을 바꾸었는지로 신뢰를 결정합니다. 숫자로 보면, 지속가능 제품의 구조적 성장과 브랜드-가치 정렬에 따른 구매 전환은 이미 거대한 트렌드가 되었고, 대표성·포용성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데이터는 이슈 피로와 발신자 기대의 분화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팬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문제 선택, 제품·운영의 실질 변화, 일관된 거버넌스입니다.
파타고니아가 선택한 구조적 해법은 그 상징적 사례이며, 나이키의 성과와 버드라이트의 실패는 핵심 고객과의 가치 적합성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공부하기 > 경영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만 아는 MZ세대? No! '우리'를 혁신하는 합리적 개인주의의 등장 (6) | 2025.08.07 |
|---|---|
| AI 시대의 러다이트, 다시 등장할 것인가? (10) | 2025.07.30 |
| 래퍼 커브(Laffer Curve)란 무엇인가? –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꿰뚫는 경제학의 직선 그 이상 (7) | 2025.07.30 |
| 세율의 곡선에서 정치경제를 읽다 – 증세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7) | 2025.07.28 |
| 경영학의 뿌리, 과학적 관리법과 행정관리론 (1) |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