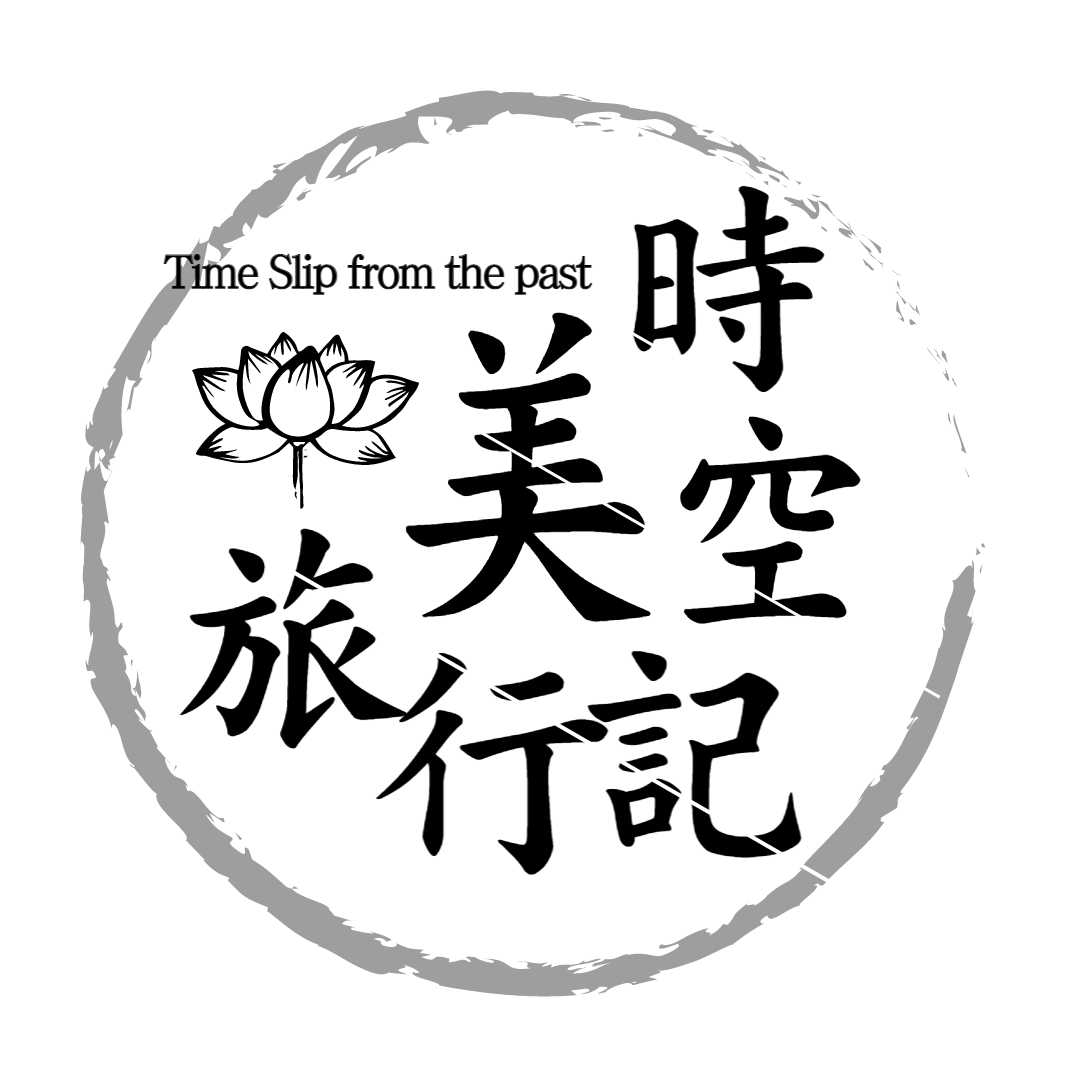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는 오를까?'
경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자주 들리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두 지표는, 사실 경제학 이론에서 매우 긴밀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론이 바로 필립스 커브(Phillips Curve)입니다.

1958년, 뉴질랜드 출신의 경제학자 A.W. 필립스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관찰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는 1861년부터 1957년까지의 영국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는 명확한 반비례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인 통찰은 곧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확장되며, 수십 년 간 주요 경제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됩니다. 즉, “실업률을 낮추면 인플레이션은 오른다”는 정설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필립스 커브는 단지 학문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960~7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정책 결정에서 핵심 지표로 작용하며, 케인즈주의적 경제운영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채택되었고,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곡선을 따라 경제를 조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곡선의 정점에서 일어난 예상 밖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입니다. 경기는 침체되어 실업률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필립스 커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이는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충격이었고, 필립스 커브의 보편성과 설명력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경제학계에서는 단순한 실업률-인플레이션 관계에 기대지 않고, 기대 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필립스 커브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밀턴 프리드먼과 에드먼드 펠프스는,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미리 예측하고 임금이나 가격에 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명확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실업률을 억지로 낮추려 인플레이션을 유도해도, 결국 사람들의 기대가 이를 따라잡아 인플레이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개념이 바로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과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입니다. 이들은 필립스 커브를 동태적인 구조로 전환시켰고, 실업률이 일정 수준(NAIRU)보다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가속된다는 ‘조건부 트레이드오프’로 이론은 정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질문은 다시 되돌아옵니다. 오늘날, 특히 한국 경제에서 필립스 커브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임금 정체, 인구구조 변화 등 복잡한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과거처럼 단순한 곡선 하나로 경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필립스 커브의 이론적 기초부터 시작해, 현대 경제학에서의 재해석,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한국 경제에서 이 이론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변수의 관계를 다시 읽어보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정책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필립스 커브의 역사와 진화: 단순한 곡선 너머의 경제 현실
1. A.W. 필립스와 곡선의 탄생
1958년, A.W. 필립스는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ge Rates in the United Kingdom, 1861–1957"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는 영국의 100년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업률이 낮을수록 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통계적 관계를 발견합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필립스 커브는 곧 거시경제학의 중심축으로 부상합니다.
이 개념은 금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로 확장되었고, 특히 케인즈주의자들은 이를 활용해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통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으며, 그 대가로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2. 스태그플레이션과 이론의 위기
그러나 1970년대 초,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서구 경제는 높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존재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새로운 경제 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전통적 필립스 커브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었고, 많은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기, 시카고학파를 대표하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Phelps)는 기존 이론을 비판하며 기대 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물가 상승을 예측하여 이에 따라 임금과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는 시도는 일시적 효과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실에 반영되어, 결국 실업률은 다시 원래의 자연 수준(Natural Rate)으로 돌아가고, 인플레이션만 남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수정된 필립스 커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됩니다:

\(\pi_t = \pi^e_t - \alpha(u_t - u^n) + \varepsilon_t\)
여기서,
- \(\pi_t\): 실제 인플레이션
- \(\pi^e_t\): 기대 인플레이션
- \(u_t\): 실제 실업률
- \(u^n\): 자연실업률 (또는 NAIRU)
- \(\alpha\): 실업률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민감도
- \(\varepsilon_t\): 기타 충격 요인
3. 현대적 시각: 필립스 커브의 약화 혹은 진화?
2000년대 이후,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필립스 커브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평탄한 필립스 커브’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합니다:
- 글로벌화: 제조업 중심의 노동 수요 감소, 해외 아웃소싱 증가
- 기술 발전: 자동화와 인공지능 도입으로 임금 상승 압력 약화
-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협상력이 약한 비정규직 비중 증가
- 중앙은행 신뢰성 강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필립스 커브는 여전히 유효하나, 매우 평탄해졌고, 다른 변수와 상호작용해야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4. 한국 경제에서의 필립스 커브 적용
한국은 필립스 커브의 전통적 메커니즘이 점차 약화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NAIRU는 3.5% 전후로 추정되며, 이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한국은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매우 제한적이며, 물가 상승 또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고용 안정성 차이
- 청년실업과 고령화: 실질적 실업률을 왜곡시키는 요인
- 정책적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신뢰 확보
5. 정책적 시사점
이제는 단순히 실업률을 조절하여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거나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필립스 커브의 유효성을 넘어서, 통화정책의 유연성, 기대 인플레이션의 관리,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물가를 통제하고자 하나,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다변화된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 분석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6. 단기 vs 장기 필립스 커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의 얼굴
필립스 커브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 중 하나는 단기(short-run)와 장기(long-run)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구분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며, 정책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단기 필립스 커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트레이드오프 관계
단기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즉,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책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정책은 실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이 수요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는 동시에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단기 필립스 커브는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를 가집니다.
📍 장기 필립스 커브: 트레이드오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밀턴 프리드먼과 에드먼드 펠프스가 강조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안정적인 관계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게 되면, 임금과 가격에 이 기대가 반영되어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지만 실업률은 다시 자연실업률(Natural Rate) 수준으로 회귀합니다.
결과적으로 장기 필립스 커브는 수직선으로 표현되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사기'식으로 높이는 것이 효과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타겟팅(inflation targeting)을 통해 장기적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 수학적으로 살펴보는 차이점
- 단기 필립스 커브:
\(\pi_t = \pi^e_t - \alpha(u_t - u^n) + \varepsilon_t\)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으면 인플레이션 상승. - 장기 필립스 커브:
\(u_t = u^n \Rightarrow \pi_t = \pi^e_t\)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이 일치하며, 실업률은 NAIRU에 수렴.
이처럼, 필립스 커브는 시간 축에 따라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이 달라지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통화정책과 고용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핵심입니다. 한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필립스 커브 관점이 중요하지만, 경기 조절 국면에서는 여전히 단기 커브의 기울기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필립스 커브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 경제학자들의 시선은 왜 엇갈릴까?
필립스 커브는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개념입니다. 단순한 실증 분석에서 출발한 이 이론은, 시간이 지나며 각 학파에 따라 해석과 평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경제학 이론들이 필립스 커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고전학파(Neoclassical Economics)와 자연실업률 가설
- 밀턴 프리드먼과 에드먼드 펠프스의 주장을 계승하는 신고전학파는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을 강조하며, 장기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 트레이드오프가 없다고 봅니다.
- 이들은 경제가 본질적으로 균형을 추구한다고 보고,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중시합니다.
- 정책적 시사점: 지속적인 경기부양은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만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 고용 효과는 사라진다는 입장입니다.
📌 신케인즈학파(New Keynesian Economics)와 가격 경직성
- 신케인즈학파는 필립스 커브를 보다 미시기초(microfoundation)에 기반해 재구성했습니다.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 조정 비용, 불완전 경쟁 시장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함을 설명합니다.
- 대표적인 모형이 뉴케인즈 필립스 커브(New Keynesian Phillips Curve, NKPC)로,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경제활동 수준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결정됩니다:
\(\pi_t = \beta E_t[\pi_{t+1}] + \kappa y_t + \varepsilon_t\)
여기서 \(\pi_t\): 현재 인플레이션, \(E_t[\pi_{t+1}]\):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 \(y_t\): 산출격차\(output gap\), \(\kappa\): 물가 민감도 - 정책적 시사점: 중앙은행의 신뢰성 확보와 명확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중요함.
📌 현대 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의 비판적 관점
- MMT는 필립스 커브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이들은 실업률은 통화량이 아닌, 정부지출과 고용정책의 결과로 본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중심의 필립스 커브 접근을 비판합니다.
- 특히 “정부는 원하는 수준의 고용을 만들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자원 배분의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 정책적 시사점: 고용보장 프로그램(Job Guarantee)을 통해 실업률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재정정책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 행동경제학과 기대 형성 방식
- 전통적 이론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합리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지만, 행동경제학은 사람들이 정보 부족, 편향, 경험 의존성 등에 따라 비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이는 필립스 커브가 정책 기대에 따라 달리 작동할 수 있으며,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합니다.
📌 실증 경제학의 도전: 필립스 커브는 사라졌는가?
- 최근에는 IMF, BIS,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실업률이 낮아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평탄한 필립스 커브(flat Phillips Curve)'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이 현상은 기존 이론이 경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복합적 요인(글로벌 공급망, 임금 협상력 약화, 생산성 정체 등)을 반영한 새로운 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립스 커브는 단순한 ‘곡선’을 넘어, 경제학자들의 가치관과 이론적 전제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면적 개념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다원성은 오히려 정책 수립에 있어 더욱 정교하고, 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결국 경제정책은 하나의 정답이 아닌, 정교한 선택의 문제임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필립스 커브? 시대를 초월한 질문과 경제학의 응답
필립스 커브는 단순히 ‘실업률이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일차원적 공식으로 이해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이론입니다. A.W. 필립스가 임금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처음 제시한 이후, 이 이론은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도전과 비판을 거치며 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이 고전 이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립스 커브가 정책 결정의 나침반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한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훨씬 더 정교한 분석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자연실업률, 글로벌화, 노동시장 구조와 같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순한 곡선 하나로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는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이 정체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인 ‘평탄한 필립스 커브’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 인구 고령화, 고용의 질 등 구조적 문제로까지 시선을 확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실업률만으로 경제 상태를 평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전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해답은 아마도, 필립스 커브를 절대적 진리로 보지 않되, 여전히 유용한 경제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라는 두 변수 사이의 긴장을 통해 우리는 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어디에서 오는가?
- 실업률이 낮다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까?
- 정책은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경제학의 매력은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필립스 커브는 여전히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지적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경제 뉴스 속 숫자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공부하기 > 경영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KT 유심 해킹 사태로 본 통신 위약금·단말기 할부 및 정책 구조 분석 (5) | 2025.05.01 |
|---|---|
| SKT 유심 해킹 사건과 무료 교체 – 유심의 구조, 보안 위협과 eSIM 대안 (6) | 2025.04.25 |
| 경제학 vs 금융학: 같은 동전의 양면일까? (1) | 2025.04.23 |
| SMART 목표 설정 - 효과적인 목표 설정으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세우기 (0) | 2025.03.06 |
| 바쁘기만 한 당신,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요? (0) | 2025.03.04 |